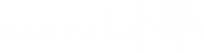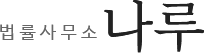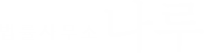“美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보잉 상대 제조물소송 추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5본문
“美서 제주항공 참사 관련 보잉 상대 제조물소송 추진”
주재한 기자 입력 2025.01.17 15:11 수정 2025.01.17 18:23
하종선 변호사, '항공기 제작' 보잉사 및 엔진제조사 상대 소송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화재 및 전원 상실이 참사 1차 원인 추정
미국 FAA· 유럽연합 EASA '항공기 인증 표준' 미충족 가능성 제기
“화재 및 고장 발생하면 안 돼···국제 소송이 증거확보·배상에 유리”

지난 3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한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항공기 제작사와 엔진제조업체를 상대로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류 충돌이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엔진에 조류가 들어갔을 때도 불이 나거나 완전한 고장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국제 항공기 인증 표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와 엔진제조업체 CFM International(CFMI)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7일 시사저널e에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조종사 과실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 탑승객들을 대리해 2017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항공기사고 관련 소송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참사의 1차 원인을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화재의 발생과 전원의 상실’로 추정하면서 “사고 당시 항공기 오른쪽 엔진에 철새로 추정되는 물체가 빨려 들어간 후 화염과 연기가 나는 장면이 촬영됐고, 기장이 8시59분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후부터 블랙박스(FDR)와 조종석음성녹음장치(CVR)자료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엔진 2개 다 꺼져 전원공급이 차단(Dual Engine Flameout)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화재와 전원 상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통으로 채택한 ‘항공기 인증 표준’에 비추어 볼 때 결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이 인증 표준에는 기체와 엔진의 ‘저항성(resistance)’ 요구 사항이 포함돼 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SKYbrary)가 정리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와 유럽 연합항공청(EASA)의 ‘항공기 인증 표준’에 따르면, 항공기 이륙과정에서 엔진에 조류가 충돌하더라도 화재 및 억제되지 않은 고장이 발생하거나 추력이 특정 범위 내로 떨어지면 안된다. 인증 표준은 ▲1.8kg~3.65kg의 조류 한 마리가 엔진 입구에 충돌하는 경우 ▲최대 1.35kg인 조류 1마리가 충돌하는 경우 ▲0.35kg~1.15kg 사이의 다양한 크기의 새 7마리가 동시에 충돌하는 경우 ▲최대 0.85kg의 소형 조류 최대 16마리가 충돌하는 경우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륙과정과 달리 착륙과정에서의 엔진의 저항성은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았다. 다만 기체나 엔진이 흡수해야 하는 운동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륙과정보다 착륙과정에서 엔진의 출력이 더 낮으므로 착륙과정에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항공기는 이륙과정에서 강한 추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저항성 규정이 있는데, 엔진이 약하게 도는 착륙과정에서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고장은 제작 인증기준에 위반되는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추정케 한다”면서 “조류 충돌로 엔진 2개가 모두 중단됐고, 이로 인해 전기와 유압이 만들어지지 않아 랜딩 기어 미작동, ADS-B의 송신 중단, FDR과 CVR이 먹통 등이 발생했다면 항공기 인증기준에 비추어 결함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보잉사와 CFMI가 미국회사로서 엔진과 항공기의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증거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점,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FAA가 사고원인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점, 블랙박스 분석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미국연방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편리한 법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받는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를 활용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액이 국내보다 훨씬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돼 판결보다 합의로 소송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소송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설명했다. 보잉737 MAX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도네시아와 이디오피아에서 추락한 두 개의 항공사고 사망자 3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받았던 사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에서 보잉사는 346명에 대한 배상을 위해 5억 달러(7300억원 상당)의 배상기금을 설치했다.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 화염이 나오고 있는 모습(빨간원). / 사진=연합뉴스 출처 : 시사저널e (https://www.sisajournal-e.com)